[사진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더해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계획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판돈을 무한정 늘리고 있다.
총합인 2500억 달러는 베트남의 1년 국내총생산(GDP)을 넘는 규모다. 중국은 이에 상응해 딱 500억 달러에 맞춘 대응안을 마련했지만 추가적인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반격을 예고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5일 중국 상무부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향해 '무역 따돌림주의(霸凌)'라는 비판이 등장했다. 그리고 요 며칠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물론, 관영언론들도 잇따라 이러한 표현을 인용하면서 '무역 따돌림주의'가 중국 정부의 공식 용어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이에 '바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는 숨겨진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중국의 무의식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과정이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몇몇 중국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바링'이 어떤 단어를 대체한 것인지가 분명하다. 중국 정부와 언론들은 얼마 전까지도 미국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면서 '패권'과 '패권주의'라는 유서 깊은 단어를 사용했다. 영어의 '헤게모니(hegemony)'에 대응하는 단어이다.
'바링'의 공식 영문 번역에서도 '무역 따돌림(trade bullying)'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번역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현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바링'은 근엄하고 진지한 국제정치학의 용어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패권과 패권주의는 마오쩌둥의 '제3세계' 개념을 통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냉전 시기 마오쩌둥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진영의 초강대국을 제1세계로, 중국을 비롯한 약소국들을 제3세계로 규정했다. 이들을 제외한 일본, 유럽 등이 제2세계였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패권적 야욕을 가진 제1세계인 미국과 소련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중국을 스스로 제3세계의 대표이자 보호자로 내세웠다.
따라서 소련이 사라지고 중국이 미국과 맞먹는 국가로 부상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미국을 패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도 이제 자신을 제3세계로 분류하는 것이 어색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패권을 추구한다고 비판하지 않고 중국을 따돌린다고 항의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의 높아진 위상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말이다.
왕따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어쨌든 왕따는 동급생 사이에서 등장한다. 미국과 중국이 어른과 아이처럼 차이가 커 어떻게 견줘도 상대가 안 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왕따시킬 정도밖에 안 된다.
단,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여전히 패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힘의 차이의 축소는 아직은 무역과 경제에 국한된 것일 수는 있다.
이와 반대로 '바링'은 중국이 자신의 약함을 자각한 표현이거나 엄살을 부리는 의미일 수도 있다.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신시대'가 선언된 이후 중국은 자신의 강대함을 주저없이 드러내왔다.
CCTV가 올해 3월에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무려 '대단하다, 우리나라'였다. 국가역량 분석에서 최고 권위자인 후안강(胡鞍鋼) 칭화대 교수는 작년 초에 논문을 발표, 중국이 경제·과학기술 등 많은 부문에서 미국을 이미 앞섰고 국방·국제적 영향력 등은 근소한 차이로 뒤지지만 곧 따라잡게 된다고 분석했다. 종합 국력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을 이미 사실상 추월했다는 것이다. 후안강의 주장은 최근 시진핑 띄우기에 열중하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촉구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링'이라는 단어는 중국이 다시 차분하게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분명한 적을 규정하는 패권주의자라는 비난과 달리 중국을 따돌린다는 비난은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에 더해 자신이 만들고 유지해 온 자유무역체제와 어울리지 않게 특정 국가를 따돌리고 있는 미국의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꾸짖으면서 중국을 진정한 국제체제의 수호자이자 도덕적인 약자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드러나듯 누구의 힘이 더 센지 끝까지 가보자는 미국에 맞서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 보자는 쪽으로 프레임을 이동시키는 효과도 있다.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인식을 반영한다. '바링'이 중국의 강함을 드러낸 것인지, 약함을 드러낸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두 측면이 모두 반영됐다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보다 약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볼 만큼은 되었고, 미국이 주도한 국제체제의 파괴자가 아니라 미국이 배신하고 있는 국제체제의 수호자로서 나서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맞는다면 중국의 섬세한 자기 인식이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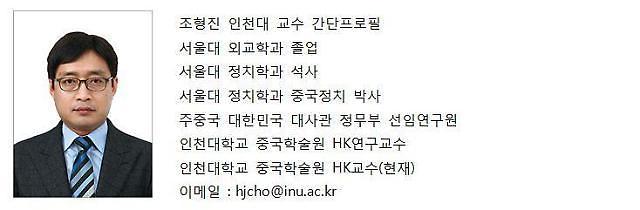







![[포토] 문혜리 사격장 자주포 합동 사격훈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7/20240417120006385747_518_323.jpg)
![[포토] 산업·5대 시중은행, 9조원 규모 미래에너지펀드 조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7/20240417110102620930_518_323.jpg)
![[포토]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6/20240416164541279599_518_323.jp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리모와 포토콜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6/20240416004815174041_518_323.jpg)
![[금투세 폐지 논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韓증시 불확실성 높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03/20240103150426112900_388_136.jpg)

